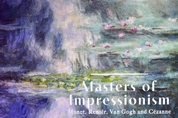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모네, 르느와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느)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느와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느) 여행지에서 미술관은 베이스캠프다. 비바람을 피하고 혹서, 혹한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길을 잃었더라도 미술관만 있으면 그곳이 곧 목적지로 변한다. 토끼굴에 빠진 앨리스가 되어 미술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볼로뉴 숲의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그랬고, 네덜란드 풍차마을의 잔스 뮤지엄이 그랬다. 좋은 그림 하나만 있으면 지루할 새가 없다. 논리가 필요 없이 오감으로 그림에 빠지는 일이 그림을 보는 기쁨이다. 노원아트센터에서 인상파 화가의 특별 전시가 있단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을 찾았다. 뜻밖에 현수막이 보인다. 전쟁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협업하는 전시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었다. 알고 보니 이번 전시는 이스라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이 우리나라로 나들이를 온 탓에 걸린 플레카드였다. 세상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새삼 느끼면서 그림을 찬찬히 보았다. 증기선, 공장 굴뚝, 증기 기관차가 이번에는 또렷이 보였다. 세느강에서 짐을 나르는 인부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나무다리를 걷고 그 뒤에는 굳건하게 증기를 내뿜는 공장이 보였다. 근대를 알리는 모습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