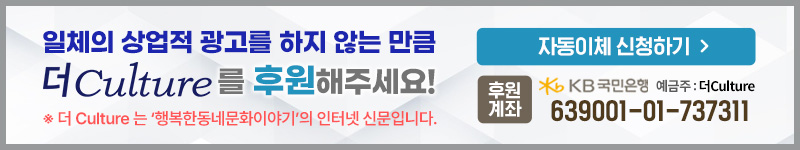유예 연장 vs 유예 불가의 첨예한 대립 어떻게 해결할까요?
(산란계 축산법 시행령을 앞두고)
산란계 사육 현황
2022년말 기준으로 국내 산란계 중 방목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닭은 451만9000마리로 전체 산란계의 6.1%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전부 공장식 사육이고 대부분의 달걀이 이렇게 생산된다. 그래서 가축 사육 농가들 특히 닭 사육을 하는 당신의 로망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열의 아홉은 방사 사육(자유롭게 방목해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도 안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넓은 시설 안에서 키우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이 말은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이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런 시설에서 생산되는 달걀 등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산란계 사육 케이지(출처 : 생생비즈)
시행될 정부 정책
물론 정부는 2018년 9월 1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로 확대해야 하며, 기존 산란계 농장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던 케이지를 좀 더 넓은 케이지로 바꾸도록 했다. 따라서 산란계 농가들은 법적 차원에서 시설을 바꿔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 농진청 개발한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출처 : 연합뉴스)
유예 연장 vs 유예 불가
사실 정부의 경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었기에 기존 농가들은 충분히 시설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기존 농가들은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더 이상 불가하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대두되는 것일까? 농가들의 소극적 반응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시행령이 현실과 실제로 부딪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요소들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
근본적 해결책은
가장 먼저 친환경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방사 사육을 추진할 땐 혐오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결사반대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닭 뿐 아니라 소, 돼지 등 다른 가축들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사육 시설을 완벽할 정도로 구비한다 할지라도 내 동네, 내 주변에 들어서는 순간 ‘혐오시설’로 결사반대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사육의 보편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는 이런 지역민들과의 대립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않음으로 시설 전환 등을 통한 사육장의 확장 또는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 정책의 성공여부인데, 결국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 제기가 없는 곳을 찾다보면 접근성이 어려운 두메산골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부수적 문제 해결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지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다른 가축 사육 농가들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마지막으로는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유예 기간이 나름 충분히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8년여의 유예기간은 시설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다시 유예기간 또는 재검토를 요하는 것은 농부들 스스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사업 전환을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땅과 씨름하는 ‘더 Culture’ 상상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