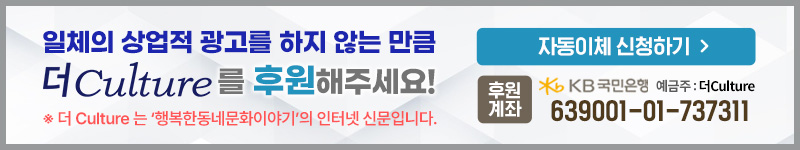‘비품(非品) 농산물’ 버릴까요? 속여서 팔까요?
아니면?
최근 당근으로 유명한 제주지역에서 비품 당근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의 시세가 평년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데다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작황 부족이 밭에서 버려진 비품 당근의 유통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주도의 한 농가는 ‘수확이 끝나면 작업 인력을 동원한 무리가 주인 허락도 없이 밭에 버려진 비품 당근을 싹쓸이 해가는 일이 허다해서 올해는 남아 있는 비품들울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비품 당근이 가공업체나 온라인을 통해 ‘못난이 당근’ 같은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의 행위는 절도
이렇게 수확 후 남은 것들을 거두어 가는 것을 시골의 경우 좋은 의미에서 용인하기도 합니다. ‘이삭줍기’라는 것입니다. 작물을 수확시 한톨 남김없이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놓친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어 필요한 이웃들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지금처럼 작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인력을 동원해 남은 작물들을 싹쓸이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전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유통업자들의 경우 단순 수확 차원을 넘어 심지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아무 노력도 없이 다른 분들의 땀 흘린 결과물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훔쳐진 상품들이 계속 유통되는 일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을 실어주게 되게도 합니다.

▶비상품 당근 (출처 : 농민신문)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제주도 당근 농가가 직면한 이 문제는 해당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농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비품 판매 업자들이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수확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이들의 행태를 보면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사법 기관의 강력한 법적 처벌'입니다. 형법상 '절도죄'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농산물 절도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소량의 농산물 또는 비품 같은 농산물 절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비품 농산물 절도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 기관에서도 지속적 계도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품은 공짜, 버려지는 것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절도 행위를 합리화하는 유통업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는 이런 상황들에 손 놓고 있는 농민이 아닌, 비품들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수 있는 기회로 삼는 농민의 역할입니다. 즉 이런 상황들을 현장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수확이 끝나는 날 지역의 유,초등,중등 아이들을 초대해서 최소한의 체험비를 받거나 아니면 농가의 자원으로 비품 농산물 수확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흙을 만져보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수확한 것을 가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골치 아픈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서와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비품을 꼭 필요한 곳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들의 경우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얌체 판매업자들로 인한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소비자들의 관심입니다. 항상 모든 상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 볼 수 없지만,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구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게 될 때 농부도, 정상적인 유통업자도, 소비자들도 서로 윈윈하게 되지 않을까요.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01sangsang@hanmail.net